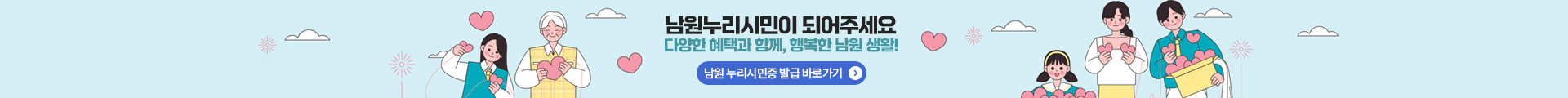서도역
서도역은 「혼불」의 중요한 문학적 공간이며 혼불 문학의 출입문이다. 매안마을 끝 아랫몰에 이르러, 치마폭을 펼쳐 놓은 것 같은 논을 가르며 구불구불 난 길을 따라, 점잖은 밥 한 상 천천히 다 먹을 만한 시간이면 닿는 정거장, 서도역은 효원이 대실에서 매안으로 신행올 때 기차에서 내리던 곳이며 강모가 전주로 학교 다니면서 이용하던 장소이기도 하다. 서도역은 2002년 전라선 철도 이설로 신역사를 준공, 이전하였으며, 헐릴 위기에 처했던 것을 혼불정신선양회 및 사매 면민들의 건의로 1930년대 당시의 모습을 복원하여 보존 할 수 있게 되었다.

삼계석문과 구로정,그리고 화전놀이
둔덕리(屯德里)에서 강을 따라 南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방죽골이 나오고 방죽골 모퉁이를 돌아서 더 들어가면 임실군 삼계면 미산(米山)후면 (後面)이 나온다. 그 후면의 산 중턱에 ‘삼계석문(三溪石門)’이라고 쓴 큰 바위가 있고 바위 아래 구로정이 있다. 구로정 옆에는 커다란 枯死木 한그루가 주제넘게 위엄(?)을 부리며 강을 굽어보고 있는데 제법 그럴싸하다.
삼계석문 아래로는 크고 깊은 골짜기를 따라 밤내와 월평천과 오수천이 合流하여 형성된 섬진강 지류가 南流하고 있다. 강 가운데 모래톱 위로 크고 넓죽한 바위 하나가 입 벌린 대합처럼 불거져 있는데 강 건너 산꼭대기에 올라앉은 토끼를 쳐다보는 거북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청정수(淸淨水)가 흐르는 이 삼계석문과 구로정 일대는 풍광(風光)이 좋아서 인근사람들이 화전놀이를 즐기는 곳이라고 한다. 이 지역도 혼불의 외곽 배경지로 설정해 볼만하다.
'앞으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따르면, 바로 이 삼계석문을 가로질러 교량이 건설될 것이라 한다. 이 곳 풍광을 해치지 않게 잘 어울리게 예술적 감각을 살린 교량으로 들어서기를 기대해 본다.
그림 삼계석문. 그 높이는 어른 키의 다섯배 정도이다.
그림 . 구로정, 삼계석문아래 너럭바위.
- 「혼불」자료
- 가세 가세 그리로 가세. 이곳 저곳 다 버리고, 생장지 매안방의 명승지를 찾아가세. 소백산맥 곧은 줄기 한 가닥을 받아 안아 동으로는 계룡산, 서쪽에는 노적봉, 남면에는 밤재 율치(栗峙) 어깨 겯고 우뚝하며, 물빛 맑은 매안천(梅岸川)과 서도천(書道川) 율천(栗川)내가 서류(西流)하다 합수하는 삼계석문(三溪石門) 뻬어남이 그 어디만 못 하리오.
- 유서 깊은 노유재(露濡齋) 아름드리 노거수(老巨樹)는 천삼백 년 은행나무, 경건하게 찾아야지 놀면서는 불경하고, 남원 읍내 광한루나 관촌마을 사선대는 오늘 갔다 오늘 오는 하루 길로 모자라니, 산도 좋고 물도 좋은 삼계석문 찾아가자 우리 고장 자랑일레.
- 어질고도 맑은 물결 양양하온 비단 계류, 바위 안고 모래 적셔 천하 절경 예 있도다.
우리 선조 대대손손 문인지사(文人志士) 배양할 제 충신 · 열사 · 효자 · 효부 끊임없이 이어나고,
명현(名賢) 달사(達士) 이름 높아 나라고을 일컬으는, 우리 동네 독서 소리 오늘 하루 쉬는구나.
저 물소리 은은한 게 글 소리와 흡사하다.
넓은 반석 꽃그늘에 마치맞게 숨어있고, 푸른 물빛 맑은 모래 도화 떠서 흐르도다.
좌우경개 둘러보니 꽃밭 조선 예 아닌가.
하루 전에 모은 떡쌀 새벽부터 찧어지고, 번철 위에 바를 기름 두루미로 이고 오는 여종 불러 분부하되,
너희들은 먼저 가서 솥을 걸고 불붙여라. 길라잡이 하려무나.
이 말을 젊은 도령 공부하는 월록서당 오늘 종일 하루 빌려, 넓은 대청 앞뒷문을 활짝 열고 달아매니,
문전옥토 싱그럽고 굽이치는 물결 이랑, 산간벽촌 앞 뒷간에 두견화가 불이 난 듯.
고직이는 쫓아나와 황송해서 조아리며 땔나무도 갖다 두고 솥뚜껑도 걸어 줄 데,
시비는 꽃을 따고 노파는 불 넣는다.
옛글에도 일렀으니 무산 놀음 하는데도 음식 없이 어이하리.
악양루도 식후 구경, 풍유남자 모인 자리 주륙진찬 제격이요,
유한정정(幽閑靜貞) 여자 놀음 꽃떡이라 제격이지.
매안 이씨 출가 따님 오랜만에 친정 와서, 삼삼오오 작반하야 모여드니 한 방이요.
악수상봉 즐긴 후에 쌓인 회포 털어놓고, 어린 딸네 산에 보내 두견화를 꺾게 하니,
아롱명주 겹저구리 자주 구름 팔랑팔랑. 잇씨물감 다홍 치마 꽃과 섞어 바꿔 볼 듯.
온 봉우리 진달래꽃 어린 품에 다 안겼다. 아이마다 한 아름씩 꺾어 온 꽃 진달래야,
화심일랑 고이 두고 화판만을 곱게 따소.
차노치덕 구울 적에 보기 좋게 얹어 붙여, 난들난들 익거드면 맛이 있게 노나 먹세.「혼불」 제 8권 315-316쪽

근심바우
- 「혼불」 검색
- 거멍굴은, 정거장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철도와 이만큼한 거리에 나란히 길이 난 산 밑을 따라 한 식경쯤 걸으면 보이는, 근심바우 옆, 몇 가호 옹색한 마을이다. 그저 다박솔이나 옻나무, 잡목들이 생긴 대로 우거진 나직나직한 동산들로 이어지던 능선의 풍경이 문득 출렁 높아지느가 싶은 무산(巫山) 봉우리 아래 자리잡은 거멍굴은, 소쿠리 하나 안에 들만치 도래도래 모여 앉은 납작한 초가집들의 마을이다.
「혼불」 3권 246쪽
- 거멍굴에서 나서면 곰방담배 석 대는 피워야 겨우 아랫물로 건너가는 도랑물에 닿는다. 그 도랑을 건너고도 또 그만큼이나 걸어가야 겨우 아랫몰에 이른다. 오랜 세월 전부터 오늘날까지, 고목(古木)의 언저리에 저절로 버섯이 돋아나듯, 반촌(班村)의 그늘에서 그들은 살아왔다.
- 아마 거멍굴(黑谷)이라는 이름도, 남루한 그들의 마을 복판에 검은 덩치로 커다랗게 우그리고 앉은 ‘근심바우’에서 생겨났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옷에서 연유된 것이 아닐까도 싶었다. 밤낮없이 흙밭에서 뒹굴고, 험한 잡일에 식구의 연명을 걸고 있자니, 손톱 발톱을 깎지 않아도 자랄 틈이 없는데, 의복인들 제때에 빨아 입고 지어 입을 수 있으며 간수할 수 있었을까, 그저 몸에 꿰고 나가면 석 달 열흘이 지나도 철이 바뀌기 전에는 누더기가 다 되도록 갈아입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었을 것이다.
「혼불」 1권 101쪽)

탕골네
- 「혼불」 자료
- 시어미가 하던 일을 물려받은 세습무(世襲巫) 당골네 백단(白丹)이는 다른 것은 몰라도 목소리 하나는 타고났다. 신들린 무당이 아니라 배운 점(占)이라고, 그 영험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통하게 여기지 않았으나, 낭랑하고 서러운 그네의 독경이며 사설만큼은 과연 구천의 혼백이라도 눈물짓게 할 만했다. 제 눈앞의 근심바우 검은 덩어리가 그대로 가슴에 와 박히고, 또 그 아래 흐르는, 피 노린내 배어든 개울물이 땅 속의 실핏줄로 스며 스며들어 무산의 온몸에 차 오르는데, 대장장이의 쇠 치는 소리까지 그 속에 꼬챙이를 지르니. 더는 참지 못하고 밤이면 캄캄한 하늘에다 토해 내는 숨. 그것이 무산의 달이었다.
이 무산 기슭 바로 밑에, 제멋대로 자라나 스산하게 어우러진 대나무로 울을 두른 초가집 서너 채가, 꼭, 산의 오지랖 자락에 대가리를 모두고 깃들인 것처럼 옹송그리고 있었다. 당골네와 점쟁이, 그리고 고인(鼓人) 잽이들이 사는 집이다.
꼬막조개 껍데기보다 더 클 것도 없는 지붕이 동고마니 덮고 있는 황토 흙벽과 지게문, 그리고 겨우 시늉이나 하고 있는 손바닥만한 마루와 토방. 여기에도 무산의 달은 푸른 물 소리로 떠오르고, 뭉친 먹물 같던 대나무 울타리는 이파리 낱낱의 비늘을 검푸르게 씻으며 몸을 솟구쳐
쏴아아
귀신이 쓰다듬는 소리로 달빛 소리를 받았다.「혼불」 3권 261쪽

고리배미,홍송숲과 비오리 주막
- 「혼불」 자료
- “민촌에 아깝다.”
고 이 앞을 지나던 선비 한 사람이 탄식을 하였다는 적송의 무리는, 실히 몇 백 년생은 됨직하였다. - 이런 나무라면 단 한 그루만 서 있어도 그 위용과 솟구치는 기상에 귀품(貴品)이, 잡목 우거진 산 열 봉우리를 제압하고도 남을 것인데, 놀라운 일이었다, 수십여 수(樹)가 한자리에 모여 서서 혹은 굽이치며, 혹은 용솟음치며, 또 혹은 장난치듯 땅으로 구부러지다가 휘익 위로 날아오르며, 잣바듬히 몸을 젖히며, 유연하게 허공을 휘감으며, 거침없이 제 기운을 뿜어 내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오직 고요히, 땅의 정(精)과 하늘의 운(運)을 한 몸에 깊이 빨아들여 합일(合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였다.
붉은 갑옷의 비늘이 저마다 숨결로 벌름거리고, 수십 마리 적송은 적룡(赤龍)의 관능으로 출렁거려 피가 뒤설레는데, 제 몸의 그 숨결로 오히려 서늘한 바람을 삼아 사시 사철 소슬하게 솔숲을 채우는 이곳을 두고, 고리배미 사람들은 그저「혼불」 제 3권 284쪽
- “솔 무데기.”
- 라고만 하였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정자(亭子)는 그만두고 모정 하나 없이 그냥 소나무 아래 무심히 앉아 쉬고 놀고 하던 것을, 바로 바짝 그 옆에서 주막을 하여 돈냥이나 모은 비오리어미가, 손님을 더 끌어 볼 욕심으로 궁리를 하다가 모정을 세웠던 것이다. 껍질만 벗긴 기둥목 소나무를 생긴 그대로 써서 네 귀퉁이에 박고, 송판으로 몇 조각 마루를 들인 뒤에, 볏짚으로 손바닥만한 지붕을 덮는 이런 일은 어려울 것도 없어서, 솜씨 좋은 마을 목수 도식이가 사람 하나 데리고서 한 며칠 뚝딱, 뚝딱, 하더니. 아주 사나흘 뒤에는 말끔히 마쳐 놓았다.
그것이 십여 년 전 일이었다.
과연 모정을 세운 것은 잘한 일이어서, 마을 사람들한테 좋은 일 했다고 치하도 받고, 그 덕에 한 걸음이라도 더 하는 사람들에게 술도 더 많이 팔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마을에 찾아드는 장사꾼들 말고도, 오고 가며 이 길목을 지나가던 길손들까지도 솔 바람 소리 성성한 적송의 무리 속에 조촐하게 세워진 순박한 모정에 눈이 가면 저절로 걸음을 멈추곤 하였다. 그래서 비오리네 주막은 종종걸음을 치게 부산하여졌던 것이다. 우선 이곳은 길이 좋았다.「혼불」 제3권 285쪽
- 이 근동 사방을 에워싼 크고 작은 뫼들의 물결과 주름 갈피에 박힌 여러 마을에서 물곬같이 흘러나오는, 남원 읍내 쪽으로 가자면 이리로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꽤 오래된 길이 구불구불 하얗게 벋어 오다가 평평하게 화악 퍼지면서 둥그러미를 이룬 곳이 고리배미였다. 길은, 마을에다 한 짐의 땅을 넉넉히 부려 놓고는 다시 홀가분한 줄기로 읍내를 향하여 흘러갔다. 거꾸로, 남원에서 북행을 하재도 마찬가지여서, 아래쪽 삼동네는 물론이고 더 먼 곳에서도 이 마을 앞을 지나야 역이고 원이고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자연히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지고, 웨만한 짐바리를 실은 마소라도 비좁지 않게 걸음을 떼어 놓는 길이 저절로 닦여지게 된 것이다.
「혼불」 제3권 286쪽

매화낙지의 매안리
- 「혼불」 자료
- 강모는 속으로 놀랐다. 저 바다 같은 들판이 모두 할머니 것이라니. 가물가물한 산 밑에까지도. 그것은 얼마나 광활하고도 아득한 넓이였는지. 그때 이상하게도 강모는 지질리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다.
“할머님 땅은 산 너메도 들 너메도 얼매든지 있지요.”
그날 강모는 학교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안서방 말이 정말인가요?”
할머니 청암부인이 강모의 말에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들판은 매화낙지다. 산에 가로 막혀서 더 뻗어나가지 못한 것이 서운은 하다만, 땅의 지세가 아주 좋으니라.”
“매화낙지?”
“매화 매(梅), 꽃 화(花), 떨어질 락(落), 따 지(地), 그렇게 쓰지.”
“꽃이 떨어지는데 무엇이 좋은가요?”
“이 사람아, 꽃은 지라고 피는 것이라네. 꽃이 져야 열매가 열지. 안 그런가? 내 강아지.”
청암부인은 어린 강모를 무릎에 올려 앉히며 궁둥이를 토닥여 주었다. 토닥이는 소리가 강모의 가슴을 쿵쿵 울리게 하였다.
그날 밤, 강모는 그 아득한 들녘 먼 곳까지 하염없이 하염없이 매화 꽃잎이 날리는 꿈을 꾸었다. 그것은 온 마을의 지붕과 언덕, 그리고 하늘을 자욱하게 덮으며 눈처럼 날리었다.
어찌 보면, 그 꽃잎들은 오류골 작은 집의 토담가에 서 있는 늙은 살구나무에서 휘날리는 연분홍 살구꽃잎인가도 싶었다.
그만큼 작은집의 살구나무는 우람한 아름드리였던 것이다.
강모와 한 살차이였던 사촌누이 강실이는, 살구나무 아래 앉아서 소꿉장난하는 것이 일이었다.
납작한 판자 위에 사금파리들을 늘어놓고, 솔잎이며 싱건지 나물 같은 것, 그리고 황토흙을 빚어 만든 시루떡과 그 시루떡에 좁쌀이나 수수를 박은 콩떡 등을 챙길 때, 작은 콧등에는 땀방울마저 솟아났다.「혼불」제1권58쪽
- 그림 매화낙지의 원형 사매면 상신리. 뒤편 계룡산에서 매화가 날리면 떨어지는 곳이 이 동네어귀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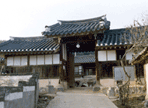
이웅재고가
전북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12호
소재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둔남면 둔덕리
이 건물은 마을의 鄕祖이며 건물 소유주의 16대 선조인 春城正 李聃孫이 朝鮮 燕山君 6년(1500)경에 건립한 이래 수차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고가이다.
장방형의 대지에 동남향하여 안채, 사랑채, 대문채가 자리잡고 있다. 안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좌우 앞쪽으로 行廊을 덧대어전체적으로 ㄷ자를 이루고 있다.
사랑채는 정면 3칸, 측면 1칸의 일자형 건물로 고종 원년(1864)에 上樑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대문채는 5칸규모로 솟을대문이며 여기에 고종 7년(1870)에 贈通政大夫吏曹參議 李文에게 내린 효자정문(孝子旌門)의 현판이 걸려있다. 현재의 건물은 대체로 조선후기의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며 조선시대의 이 지방 士大夫 住居生活의 면모를 잘 간직한 건물이다.